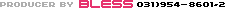울산 현대 김호곤 감독(62)이 과감하게 지휘봉을 내려 놓았다. 김 감독은 4일 서울 남산 서울클럽에서 기자들과 오찬 자리에서 '자진 사퇴'를 알렸다. 동석한 구단 관계자 및 코칭스태프가 몰랐을 정도로 예상 밖의 사퇴였다.
울산은 K리그 클래식 1위를 달리다 지난 1일 포항 스틸러스와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종료직전 김원일에게 결승골을 내주며 0-1로 패해 준우승에 그쳤다. 1위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하겠다는 것이 김 감독의 뜻이다.
하지만 형식상 자진 사퇴였을 뿐 내용상으로는 구단의 경질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축구계의 전반적인 생각이다. 김 감독은 3일 서울에서 열린 K리그 대상 시상식이 끝난 뒤 구단 사장인 권오갑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를 만나 "구단 고민을 덜어드리고 싶다"라며 사의를 전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 감독의 사퇴 과정에는 복잡함이 얽혀있다. 올 시즌 내내 김 감독은 소문으로 괴로웠다. 특정인이 울산 감독으로 올 수 있다는 소문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1년 재계약 후 옵션 행사로 연장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했던 '비정규직' 신세인 김 감독에게는 보이지 않는 압박이었다. 2년 계약에서 1+1으로 바꿔 김 감독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특정인과 구단 고위층의 관계가 끈끈해 김 감독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는 소문이 축구계 안팎에 파다했다.
김 감독도 고민이 많았다. 시즌 시작 직전 기자에게 "다 내려놓고 한적한 바닷가 마을로 가서 집이나 짓고 조용히 살고 싶다"라며 감독 수행의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울산은 2005년 정규리그 우승 이후 2009년 김 감독이 지휘봉을 잡기 전까지 종이컵 소리를 들을 정도로 격이 떨어졌던 리그컵(2007년) 우승이 전부였다. 2006년 한중일 클럽이 참가하는 A3 챔피언십 우승이 그나마 내세울 수 있는 대회였다. 정규리그에는 4위 이상을 진입하지 못했다.
김 감독 부임 당시에는 주요 선수들이 팀을 빠져 나가 어려움이 컸지만 2011년 6강 플레이오프에서 6위로 챔피언결정전까지 진출해 준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지난해는 구단 최고의 성적인 아시아 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격을 높였고 AFC 올해의 감독상 주인공이 됐다. '철퇴축구'라는 브랜드 구축으로 구단 마케팅에 도우미 역할도 했다.
우승 후유증은 대단했다.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끌었던 곽태휘(알 샤밥), 고슬기(엘 자이시), 마라냥(제주 유나이티드), 에스티벤(빗셀 고베)이 모두 이적했고 이근호, 이호, 이재성(이상 상주 상무)은 군 입대로 팀을 떠났다.
주전의 절반이 나가 떨어진 상황에서 김성환, 한상운, 마스다를 보강한 것이 전부였다. 나간 이들보다 지명도에서 떨어져 걱정이 많았다. 까이끼와 호베르또는 부상으로 이탈해 있다가 시즌 중, 후반부에 돌아와 사실상 전력 외의 자원이었다.
내려놓고 싶었던 김 감독을 자극한 것은 책임감이었다. K리그 14개 구단 중 최고령 감독이었지만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다. "노장은 녹슬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닳고 닳아 사라지는 거다"라며 '노장'이라는 호칭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고 경쟁력이 충분히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김 감독도 사실상 '프런트의 힘'에 힘없이 쓸려갔다. 성적에 목을 메는 행태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누리꾼들은 "2등해도 사임이라니 무서워서 감독하겠느냐"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지만 눈 앞의 성적만 원하는 구단 고위층에 김 감독은 실패자였다. 당분간 김 감독은 해외로 떠나 머리를 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