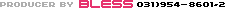|
34번째 민족대표, 프랭크 스코필드(석호필)
탑골공원에 함성이 가득 울려 퍼졌다. 1919년 3월 1일, 빼앗긴 주권을 되찾으려 수많은 군중들이 만세 운동을 벌였다.
그런데, 역사적인 '그날'을 제안한 사람, 또 역사적인 '그날'을 기록하고 알린 사람은 외국인이었다. 바로 석호필, 독립선언문에 기록되지 못한 34번째 민족대표, 프랭크 스코필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1889년 영국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1907년 캐나다로 이민, 토론토 대학 수의과를 졸업하였다. 1916년 당시 한국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연세대 전신) 교장으로 있던 에비슨(Avison)의 초청으로 세균학 교수로 한국에 들어왔다.
영어로 강의하다가 한국어를 공부하여 1917년 한국어 시험에 합격하고 선교사 자격도 받았다. '스코필드'를 음차하여 '석호필(石虎弼)'이란 한국어 이름도 가졌다.
1919년 초 미국 친구로부터, 윌슨 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를 표방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갑성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한국에서도 모종의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언질을 주어 3·1운동의 불을 지피는데 한 역할을 하였다.
3·1운동이 일어나자 독립운동 현장을 직접 카메라에 담고 독립운동의 실상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피해를 당하는 학생들을 외국인 신분을 이용하여 구출하고, 일본 경무국장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구출하기도 했다.
3·1운동은 지방으로 급속히 퍼졌다. 특히 화성시 향남면 제암리에서는 일본군 관계자가 마을 주민들에게 알릴 사항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제암리 교회에 모이도록 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자 문을 잠그고 총을 난사하고 불을 질러 26명의 양민을 학살하였다. 마을에서 만세운동을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스코필드는 삼엄한 경비를 따돌리고, 수원에서 자전거로 제암리까지 잠입하였다. 스코필드는 소아마비 증세로 왼쪽 팔과 오른쪽 다리가 마비되어 한쪽 다리로 자전거를 배워 탔다. 거기서 몰래 제암리의 총살·방화 현장을 촬영하는데 성공하였다. 부근의 방화 만행 현장도 둘러보고 귀경하였다.
일본의 제암리 만행과 한국인의 독립운동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 캐나다, 미국으로 나가는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해외에 보도토록 하였다. 마침내 일제의 잔혹상이 세상에 폭로되었고, 일본의 언론에서조차 제암리 학살 사건에 대한 질타의 기사가 나왔다.
또 일본의 선행을 외국인에게 홍보하기 위한 어용 영자신문 에 일본의 만행을 비난 고발하는 글을 무기명으로 자주 실었다.
수원에서 서울로 오는 기차에서 이완용과 조우하였다. 이완용이 “어떻게 하면 기독교 신자가 될 수 있소?”라고 묻자, “2천만 국민에게 사죄해야 될 수 있소.”라고 대답했다.
스코필드가 한국인을 돕는 것이 알려지자 조선총독부에 의해 강제 출국을 당하였다. 그는 캐나다로 건너가 대학교수로 활동하다가 한국을 수차례 방문하며 한국을 잊지 못했다.
그의 3·1운동 기록과 사진을 한국에 기증하여 보도되었다. 1960년 대한민국 문화훈장을, 1968년에는 건국공로훈장을 받았다.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강의하였고, 1969년부터 한국에 영구 정착하여 여생을 한국에서 마쳤다. 1970년 외국인 최초로 한국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김장환 프로필>
전, 용인예총 사무국장
전, 용인문화원 사무국장
현, 용인문화콘텐츠연구소장
현, 국립민속박물관 전통문화 강사
|